2025. 1. 14. 05:00ㆍ35mm


내달 13일, 여느 때처럼 베를린 국제 영화제(Internationale Filmfestspiele Berlin (Berlinale)) 막이 오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오는 유러피언 필름 마켓(European Film Market) 사업의 "주목할 국가(Country in Focus)"로 올해는 스페인이 선정됐고, 전 세계, 최대 열네 편의 장편 데뷔작이 경쟁하는 "퍼스펙티브즈(Perspectives)"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공식 개막작으로는 1998년 작, <롤라 런 (Lola rennt)> 이후, 현대 독일 영화계 주요 감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톰 티크버의 신작, <더 라이트 (Das Licht)>가 나섭니다. 최근에는 ARD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 (Babylon Berlin)>을 지휘하며 안방 시청자를 사로잡은 티크버 감독은 벌써 세 번째(2002년의 <헤븐 (Heaven)>, 2009년의 <인터내셔널 (The International)>에 이어), 자기 작품을 영화제 개막작으로 내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올해 베를리날레는 역대 일흔다섯째 행사이자, 트리샤 터틀(2018년부터 2022년까지 런던 영화제 예술 감독을 역임했습니다)이 감독하는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개막작은 현장을 찾은 전 세계 각계각층의 인사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그해 영화제의 얼굴로서 상징성이 큽니다. 예술 측면의 카를로 카트리안과 사업상의 마리에터 리센베이크,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가 트리샤 터틀에게 바통을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주관한 지난해 베를리날레는 <오펜하이머 (Oppenheimer)>로 아카데미 수상, 세계적인 유명 배우로 우뚝 선 킬리언 머피의 최신작, <이처럼 사소한 것들 (Small Things Like These)>과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상영 직후 평단 반응은 사뭇 엇갈렸습니다. 다른 영화와 비교하여 그 예술적인 성취, 표현법 따위가 "혁신적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카트리안과 리센베이크가 "마지막"에 걸맞게, 시종일관 음울하고 무겁게 설정된 분위기보다 더 나은 축제 시작을 기획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베를린의 한 유력 매체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맷 데이먼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이 개막작 선정이 미래에 더 많은 할리우드 상업 영화를 유치하기 위한 포석은 아니었는지 비꼬듯이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킬리언 머피는 물론, 극 중 수녀원장 메리 역할로 은곰상 조연 최우수연기상(Silberner Bär/Beste Schauspielerische Leistung in einer Nebenrolle)을 거머쥔 에밀리 왓슨 등, 출연진의 탁월한 연기가 대단히 흡인력 있는 작품을 완성했으며, 각본 자체도 원작 소설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면서 적절한 각색을 가미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영화제 폐막 후, 영화가 세계 각국의 영화광을 직접 찾아 나서면서는 후자의 진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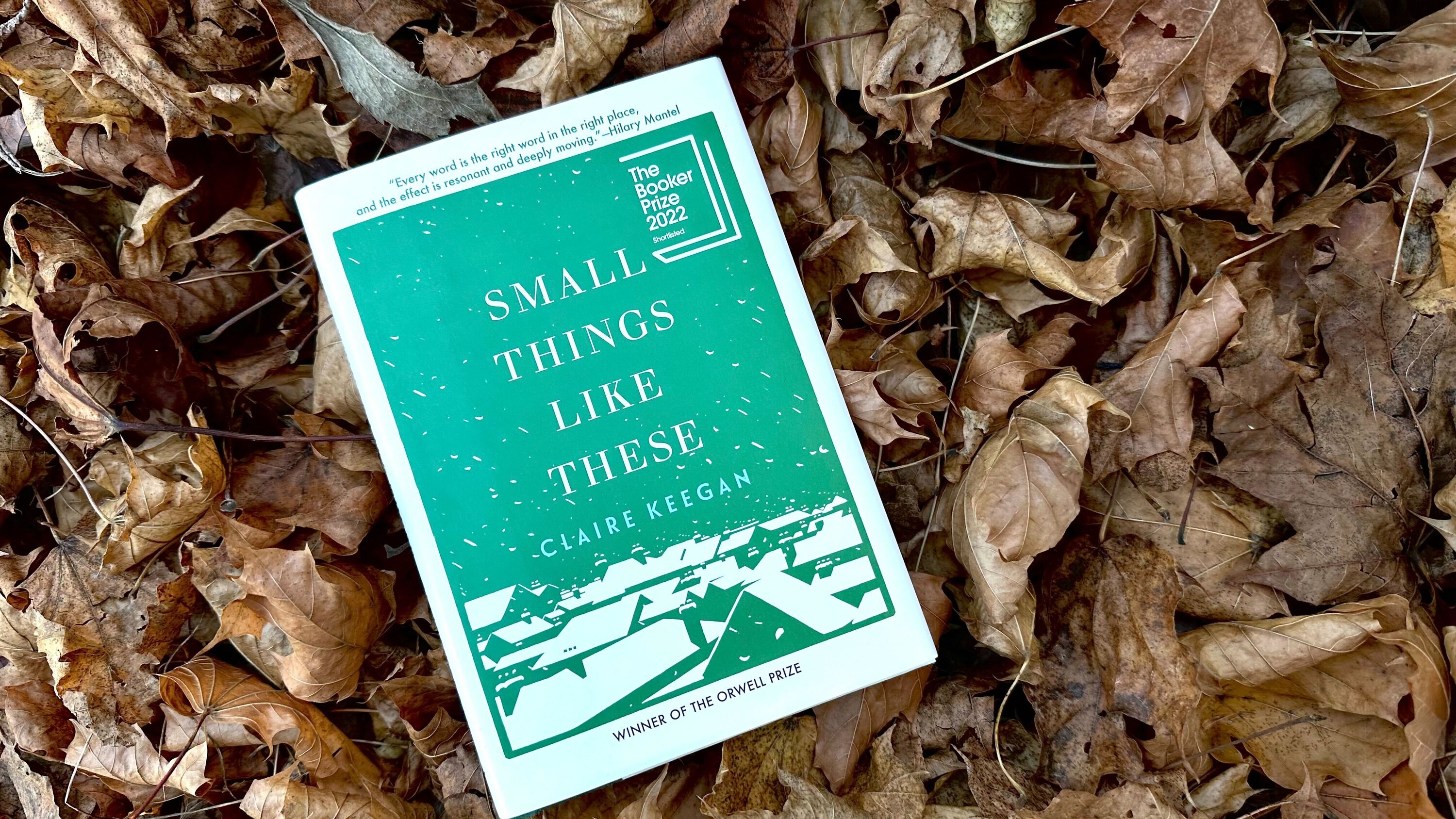
영화의 바탕이 된, 같은 이름의,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지난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 여섯 작품에 포함됐습니다. 글자 수는 앨런 가너의 <<Treacle Walker (152쪽 분량)>>보다 많았지만, 쪽수(116쪽)를 기준으로는 키건의 출판물이 부커상 "역대 제일 짧은 분량의 후보"가 됐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내세운 중심인물, 빌 펄롱의 "말수 적은 성격"에는 이보다 긴 분량이 어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주인공의 말수가 적다는 데서 영화 제작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부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으니, 인물의 생각, 고뇌를 따옴표 밖의 문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책과 달리, 영상물에서는 배우의 섬세한 연기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다행히 킬리언 머피는 다른 누구보다도, '최소한의 대화만으로도' 한 남성의 정신적인 고통, 그 영혼의 깨지기 쉬운 습성, 상태를 잘 전달하는 재주꾼입니다. 장면마다 잡히는 그의 표정에 마음이 시달리는 괴로움이 묵직하게, 꾹꾹 눌러 담기지만, 그의 능력은 마치, 자칫하면, 감정에 매몰되기 쉬운 소재를 치우침 없이 풀어내는 클레어 키건의 문장력과 같아서, 과함이 없이 담백하게 세밀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가 인물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의도를 파악하고, 고통을 확인하게 한다며, 자신은 등장인물이 사색에 잠기거나, 혼자 화면을 채우거나, 침묵하고, 일하는 모습을 제일 흥미롭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많지 않은 대사로 감정을 내면화하는 빌 펄롱에게서 할리우드에서도 내성적이고 말수 적기로 소문난 킬리언 머피, 배우의 본모습이 언뜻 겹쳐 보인 이유가 여기 있을 터입니다. 신경 쇠약을 겪는 주인공이 우연히 목격한, 수녀원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여성의 고통에 용기 냄으로써 자기 비탄에서 빠져나오는 일종의 모순을 관객은 숨죽인 채 따라갑니다. 영화의 감독, 팀 밀란츠는 소설을 읽고 작가의 간결한 문장이 지닌 힘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를 그대로 구현하려고, 관객이 주인공의 눈동자 뒤에 숨은 괴로움, 번민을 포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연출'을 삼갔습니다. 카메라는 극이 진행되는 내내, 그를 조용히 담아내는 도구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It would be the easiest thing in the world to lose everything, Furlong knew. Although he did not venture far, he got around - and many an unfortunate he'd seen around town and out the country roads."
원작 소설을 성실하게 따른 영화의 줄거리는 독자들이 익히 아는 대로입니다. 주인공, 빌 펄롱은 웩스퍼드주 남서쪽, 뉴 로스의 석탄 소매업자이자, 다섯 딸의 아버지입니다. 그 내외는 "마을 내 유일한, 여자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가톨릭 학교, 세인트 마거릿츠(St. Margaret's)에 다섯 딸을 모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가톨릭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 그 이상의 의미와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이 극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펄롱이 목표하는 세인트 마거릿츠 입학의 당락은 물론이고, 그 어떤 작은 결정도 수녀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내려질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주요 고객인 그 수녀원에 물건을 내려서 쌓아두러 갔다, 높은 담장 너머에 숨겨진 어둠을 뜻밖에 마주하지만, 망설임 없이 교회와 맞서거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군중 앞에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자기 가족이 걸리지 않은 일에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들이밀기/지키기 쉽지만, 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순간, 그러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더구나, 빌 펄롱은 가진 전부를 잃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는 점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소설은, 따라서 그를 각색한 영화는, 악명 높은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을 똑 닮은 극 중 사건으로 강하게 암시합니다. 아일랜드 현대사, 넘어서는 가톨릭 현대사의 부끄러운 과거가 된 이는 젊은 여성들, 특히 미혼모들을 데려다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금하고, 휴일도 보수도 없이 세탁부로 노동에 동원하며, 심지어는 그 자녀의 운명 또한 돈을 받고 입양 보냄으로써 결정해 버린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종교와 국가가 결탁하여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괴물의 민낯이 널리 고발됐지만, 여전히, 정확히 얼마나 많은 여성이 그곳에 감금되고, 착취당했는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소설의 끝에 작가는 삼만 명 수준이 설득력 있는 추정치라고 주장하는데, 못해도 1922년부터 자행된 이 비인간적인 만행은 강산이 일곱 번 바뀌고도 한참 지난 1996년에야 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현실에서 전국에 뻗어 나간 고통과 상실, 수없이 깊은 재해 신경증과 고문의 세월을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품을 가치가 있는 비통함으로, 흔들리기 쉽고 꺾이기도 쉬운, 갈대와도 같은 개인의 도덕심으로 증류합니다. 가톨릭교회의 노골적인 잔인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랜 침묵과 방관으로 이러한 인권 유린이 대규모로, 오래도록 자행될 수 있도록 한 더 큰 공동체의 무심한 공모에 무대 조명을 비춥니다. 그러면서도 그 단단히 굳은 악함에 아주 조그만 금이 가도록 한 장본인이 비범한 힘을 지닌 '영웅'이 아니라, 상처받은, 지극히 평범한 남성이라는 점(킬리언 머피는 작가가 남성을 주인공으로 세웠지만, 다시, 그의 시선에서 본 여성들이 겪는 아픔을 이야기의 핵심으로 삼은 점이 흥미로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이 이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화려한 기교를 부리지 않은 영화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적 특징이라면, 주인공의 어릴 적 회상이 중간중간 끼어든다는 점을 들만합니다. 그 지난날의 기억이, 과거가, 지금, 그가 수녀원의 석탄 창고에서 발견한, 그곳에 갇힌 사라(자라 데블린이 분했습니다)라는 젊은 여성의 곤경과 서로 포개어짐으로써 동요합니다. 빌 펄롱은 사생아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받아주고 그를 거두어 준 윌슨 부인(<왕좌의 게임> 캐틀린 스타크 역으로 잘 알려진 미셸 페얼리가 분했습니다)의 "친절함" 덕에 그는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거리로 내몰릴 위기, 지독한 가난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행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의연함을 학습했고, 그런데도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통과 수치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라의 발견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무심코 들어간 수녀원 안에서 떨고 있는, 도움을 애타게 구하는 여성들과 만남은 단숨에 그 기억을 소환하여 그의 일상에 무거운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결국, 빌 펄롱의 머릿속에서 미처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소용돌이치는 숱한 생각이 울림을 주며 극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어쩌면, 주인공과 관객 일체는 처음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를 실행에 옮길 용기를 내기까지 과정이 가시밭길일 뿐.

"Now, Furlong was disinclined to dwell on the past; his attention was fixed on providing for his girls, who were black-haired like Eileen and fairly complexioned.
…
Sometimes Furlong, seeing the girls going through the small things which needed to be done - genuflecting in the chapel or thanking a shop-keeper for the change - felt a deep, private joy that these children were his own.
'Aren't we the lucky ones?' he remarked to Eileen in bed one night, 'There's many out there badly off.'
'We are, surely.'
'Not that we've much,' he said, 'But, still.'"
때로는 사회적인 탄압과 착취의 거대한 구조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눌린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동작하기도 합니다. 빌 펄롱은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성실하고 정직한 고용주이고, 지역 사회의 주제넘지 않은,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체면은 사라를 못 본 체하지 않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넴으로써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할 때마다 그가 겪어야 하는 고립감과 압박감을 가중합니다. 빌의 부인이며, 다섯 딸의 어머니인 아일린(아일린 월시가 연기했습니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한순간 잃을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주지시키며 버티라고, 고개 숙이고 "옳은 사람들의 편"에 머물라고 설득합니다. 아일랜드 문화권에서 이는 대체로 가톨릭교회에 반하지 않는 쪽에 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막달레나 수녀원에 갇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빌과 아일린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술집에서 만난 키호 부인(헬렌 비언이 연기했습니다)도 "빌과 그 가족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킬리언 머피가 영화 중 제일 마음에 든다고 밝힌, 빌 펄롱과 수녀원장 메리가 찻잔을 들고 나눈 대화 장면 이후입니다. 둘은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 생명, 인권이 걸린 어마어마한 일이 차담을 내놓은 장소 뒷배경에 깔렸습니다. 아일린과 사이에 딸이 다섯인지 여섯인지 물으며 세인트 마거릿츠 입시를 넌지시 주제로 내놓고, "아일린을 위해" 정성스레 돈을 담은 편지봉투를 건네는 메리의 행동은 그의 막강한 힘을 빌과 관객에게 깨우칩니다. 이 공고한 사회적인 압력에 맞서 강직한 인간성을 발휘하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성탄절 맞이에 필요한 비용을 걱정하는 아내를 양심의 핑계 삼아 그 봉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한 남성의 무거운 뒷모습을 봅니다. 성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어서 아쉽겠다는 수녀원장의 자극과 자신은 어머니의 성을 따랐지만,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받아치는 주인공의 모습이 지극히 불편한, 정교하게 계산된 찰영 구도와 발소리, 조곤조곤한 말소리, 잔과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평범하지만, 심상치 않은 공기로 방을 가득 채웁니다. 아마, 섬세하고 차분하게 증폭하여 구현해 낸 이 무거운 공명이 배우가 이 순간을 인상적인 촬영으로 기억하고, 첫손에 꼽는 이유일 터입니다. 키호 부인은 빌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상에 이르려고 기울인 그 모든 노력을, 장차 세인트 마거릿츠를 나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다섯 딸과 단란한 가정을 기억하라며, 지역의 실세인 수녀들과 척지지 말라고, 착한 개는 물지 않는다고 설교합니다.

"Furlong pulled up and bade the man good evening.
'Would you mind telling me where this road will take me?'
'This road?' The man put down the hook, leant on the handle, and stared in at him.
'This road will take you wherever you want to go, son.'"
"Furlong carried on uneasily, thinking back over the Dublin girl who'd asked him to take her here so she could drown, and how he had refused her; of how he had afterwards lost his way along the back roads, and of the queer old man out slashing the thistles in the fog that evening with the puckaun, and what he'd said about how the road would take him wherever he wanted to go."
결국, 빌 펄롱은 사라를 어둡고 비좁은 수녀원의 석탄 창고에서 구출해 냄으로써 자기 영혼을 고통의 굴레에서 끊어냅니다. 그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라서 발휘한 용기가, 그래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현실에 순응하는 아일린, 키호 부인과 달리, 수녀원의 여성들을 구해내려고 마련된 "정의의 사도"라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 갇힌 여성의 눈동자에서 바닥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읽고 태연하게 성탄 아침 미사에 나간 자신의 위선을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는 처음 수녀원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을 마주한 뒤, 트럭을 몰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내달린, 어디로든 닿을 수 있는 길에서 자기 영혼을 잠시라도 덜 괴롭게 할 하나의 방향을 마침내 찾았을 뿐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물과 비누로 하루치 검은 먼지를 씻어내듯, 자기 마음에 켜켜이 쌓인, 해묵은 먼지를 걷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클레어 키건이 그려 낸, 킬리언 머피가 묘사해 낸 주인공은 우렁찬 목소리와 유창한 감정 표현, 생생한 증언으로 청중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는 어린 날의 상처, 유령이 도사리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해안선에 서서, 책 겉표지와 영화 포스터에 적힌 문구(제목)처럼, "합산하여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는, 사소한 각각"을 관찰하는, 깨지기 쉬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그가 전면에 나서는 동시에, 말수 적고 섬세한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르며, 미약할지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음을 알려주어, 더욱 짙은 감동을 안깁니다. 일상의 그 무엇이라도 당연하게, 사소하게 인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연민과 이타주의로 무관심과 관성을 극복하여 이기는, 부드러운 희망의, 새로운 성탄절 이야기의 따뜻함을 빚어냈습니다. 영화 연출을 맡은 팀 밀란츠는 초기에 발표한 단편, <The Sunflyers>와 <Duffel>에서처럼 톡톡 튀고 풍자적인 작품도 만들 줄 알지만, <The Responder>, <피키 블라인더스 (Peaky Blinders)> 등, 어둡고 어딘가 음울한 분위기의 시리즈로 더 유명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전자보다 후자와 닮은 점이 많은 듯이 보이는데, 제아무리 짙게 깔린 어둠이라도, 희미하나마 한 줄기 빛을 완전히 덮어낼 수는 없음을 전파하니, 더욱 특별합니다.

"As they carried on along and met more people Furlong did and did not know, he found himself asking was there any point in being alive without helping one another? Was it possible to carry on along through all the years, the decades, through an entire life, without once being brave enough to go against what was there and yet call yourself a Christian, and face yourself in the mirror? How light and tall he almost felt walking along with this girl at his side and some fresh, new, unrecognisable joy in his heart. Was it possible that the best bit of him was shining forth, and surfacing? Some part of him, whatever it could be called - was there any name for it? - was going wild, he knew. The fact was that he would pay for it but never once his whole and unremarkable life had he known a happiness akin to this, not even when his infant girls were first placed in his arms and he had heard their healthy, obstinate cries.", Keegan, C. (2021). Small things like these. Grove Press.
작품의 시간대는 1985년, 성탄절을 코앞에 둔 12월입니다. 영화 초반,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덱시스 미드나이트 러너스(Dexys Midnight Runners)의 널리 사랑받은, 1982년 곡, <Come On Eileen>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를 최소한 그 근방으로 특정해 줍니다. 그가 아니라면, 작품은 적어도 막달레나 수녀원의 문이 열려 있던 그 어느 때라도 배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도시를 뒤덮은 안개와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 맺힌 유리창, 주인공의 손을 검게 칠한 석탄 먼지, 그를 씻어내며 구정물로 가득한 세면대 등, 이따금 카메라가 눈을 돌리는 사소한 요소들이 작품이 그리는 시기를 유추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늑한 펄롱 가족의 집이나, 그와 비슷하면서도 일부 대비되는 인상을 주는 칙칙한 영상을 뚫고 객석에 전달되는 정신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합니다. 빌과 아일린을 압박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목적 없고 말수 적은 술집에서 한담 못지않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반갑지도, 낯설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성탄절이 가까워져 오며, 뉴 로스의 밤에는 축복을 부르는 전구들이 반짝입니다. 이 빛은 끔찍한 혐오감과 깊숙한 어둠을 발산하는 수녀원 복도의 드문드문 켜진 조명의 빛과 서로 대조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빌 펄롱을 무겁게 짓누르는 정체 모를 슬픔, 감지된 불의, 버거운 근심, 그리고 밤마다 창문 앞에 앉아 잠을 청하지 못하던 그가 그 마음의 병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과정은 여느 때보다 빨리, 잔혹한 짐을 안고 와 버린 성탄절로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탄 전야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버린 눈이 서늘하다 못해 스산하고 추운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면, 사소한 하나하나 관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호주머니의 잔돈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괜찮다는 상대에게 정말 괜찮은지 재차 확인하는 주인공의 정신적인 해방은 그가 실어 나르는 석탄처럼 까만 물로 뜻밖의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참담함, 비통함과 함께해야 했던 지난 12월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재정립하는 성탄절 우화와 같이, 당장 앞에 놓인 "안정"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한, 힘에 대한 무관심함, 무감함, 애써 행하는 자기합리화를 딛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움을 내재한 진실을 향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시대를 초월한 이 이야기를 마침내 완성해 줄 테니.
'35m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브스턴스>: 창조된 세계 속 주인공의 공포감이 관객의 경험으로 (8) | 2024.12.22 |
|---|---|
| <아노라>: 자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 앞에서 폭발시킨 감정 (2) | 2024.11.27 |